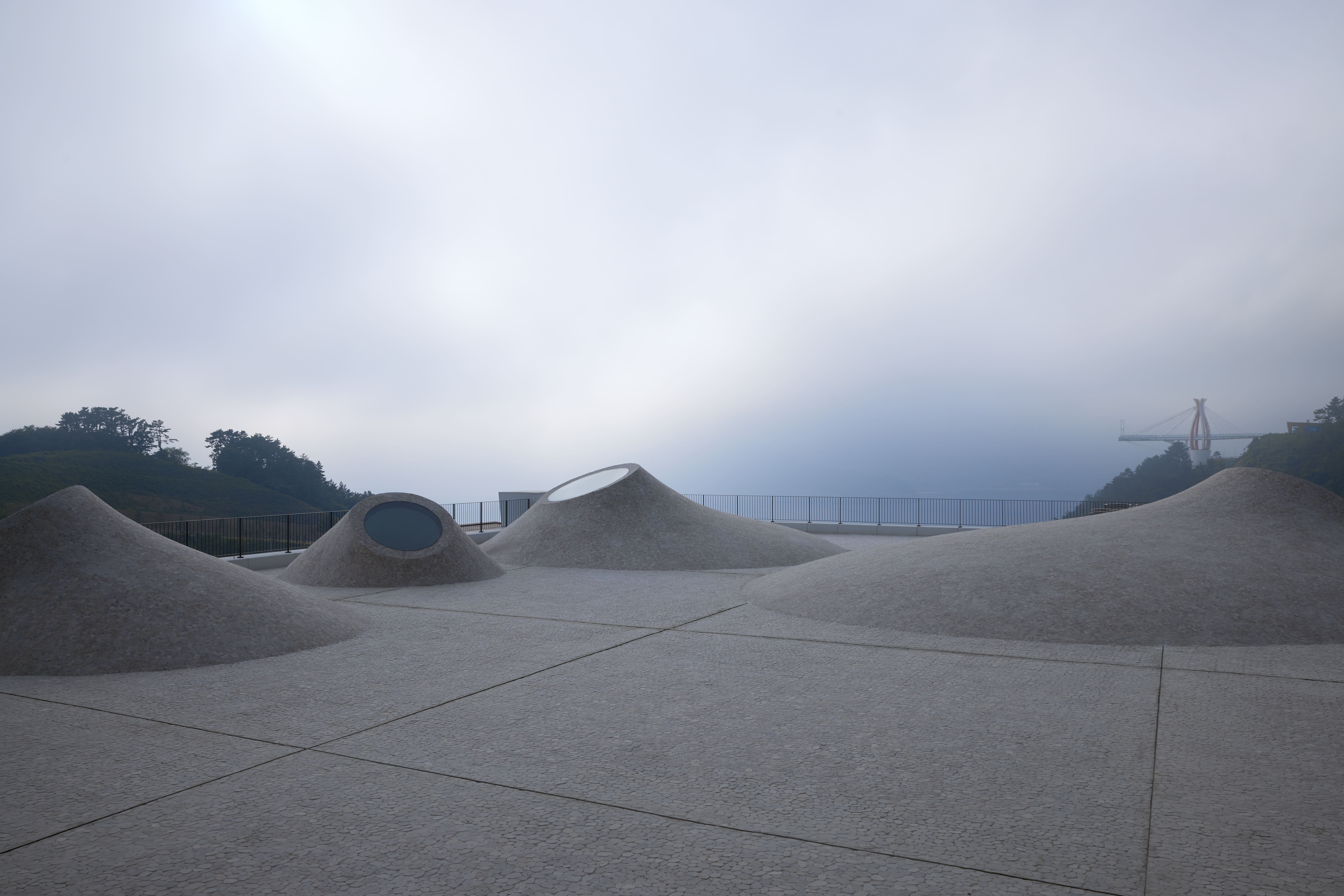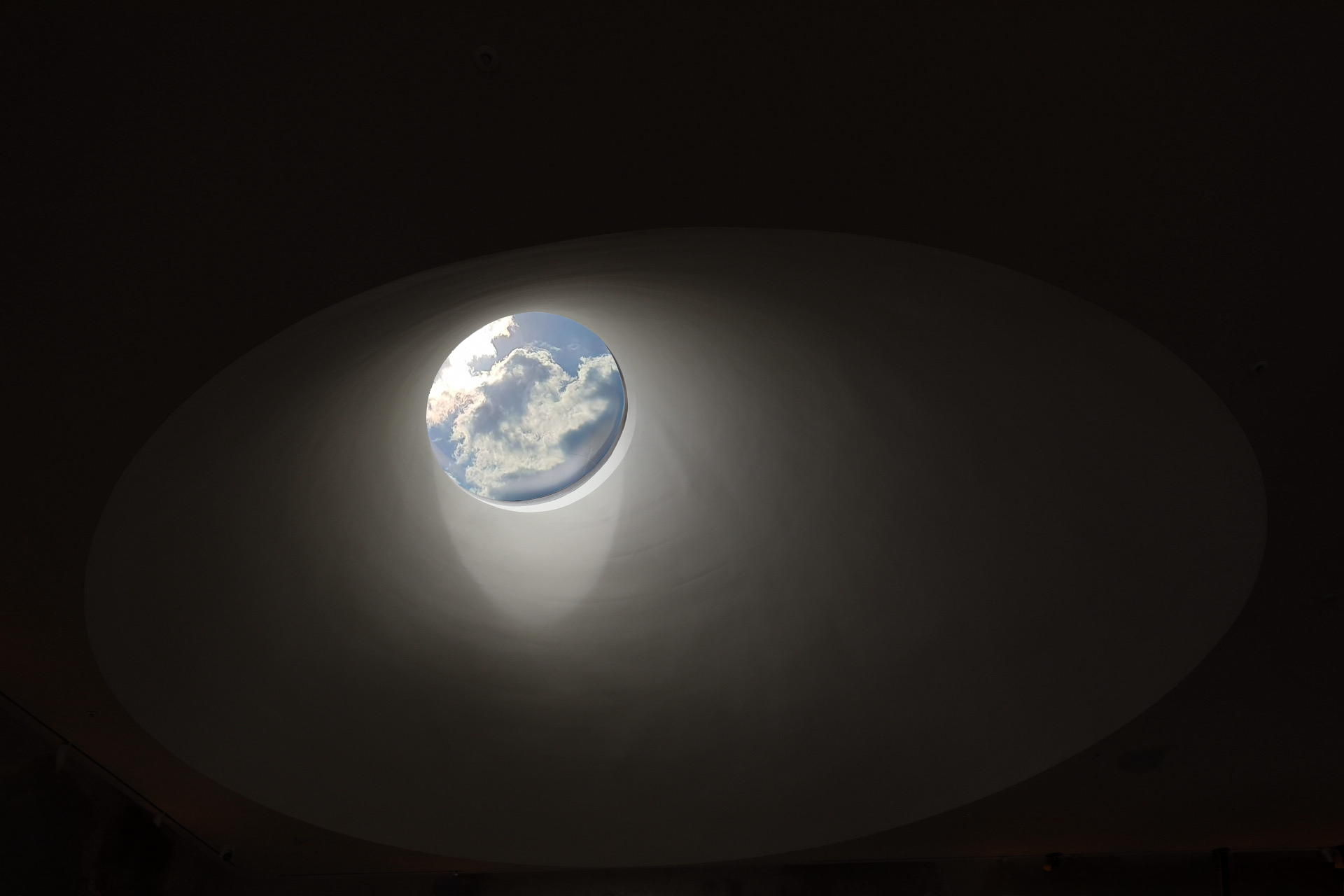쏠비치 남해 바래베이커리 - 메리디오네
DESIGN NONESPACE
PHOTOGRAPH Woojin Park
SITE 115, Misong-ro 303beon-gil, Mijo-myeon, Namhae-gun
USAGE Bakery&Cafe
쏠비치 남해 바래베이커는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다도해 끝자락의 해안을 마주한 위치에 자리해 있다. 남해는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지형과, 파도가 빚어낸 암석 해안, 물때에 따라 달라지는 해안선 등 독특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으며, 죽방렴과 바래 작업 같은 전통 어업 방식이 지금까지도 지역의 생활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공간은 이러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단순히 장식처럼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래’라는 행위가 지닌 고유한 시간의 흐름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공간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았다. 이곳은 단순히 빵을 고르는 장소를 넘어, 바다의 흐름과 그 기억이 조용히 머무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실내는 외부와 부드럽게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절제된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메인 쇼케이스는 굴곡진 해안선을 따라 걷는 바래의 동선을 표현한 다양한 높이의 곡선형 구조로 계획되었고, 디스플레이 하부에 조성된 물결 조명은 시각적 깊이를 더하며 바다와 가까운 감각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다.
천창은 따개비의 형상을 본떠 구성되었으며, 원형 타공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일정한 패턴으로 실내에 머무른다. 빛의 강도와 각도는 시간대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며, 그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도 차분히 달라진다.
공간은 이러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단순히 장식처럼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래’라는 행위가 지닌 고유한 시간의 흐름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 공간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를 핵심 질문으로 삼았다. 이곳은 단순히 빵을 고르는 장소를 넘어, 바다의 흐름과 그 기억이 조용히 머무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실내는 외부와 부드럽게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절제된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메인 쇼케이스는 굴곡진 해안선을 따라 걷는 바래의 동선을 표현한 다양한 높이의 곡선형 구조로 계획되었고, 디스플레이 하부에 조성된 물결 조명은 시각적 깊이를 더하며 바다와 가까운 감각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다.
천창은 따개비의 형상을 본떠 구성되었으며, 원형 타공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일정한 패턴으로 실내에 머무른다. 빛의 강도와 각도는 시간대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며, 그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도 차분히 달라진다.
카운터 뒷벽(백월)은 따개비를 연상시키는 거친 마감과 불규칙한 타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개 테라조 마감과 함께, 침식과 축적이 반복된 바다 지형의 질감을 카운터에 은근하게 드러낸다. 죽방렴의 그물망 구조는 커튼, 조명, 일부 가구의 패브릭 디테일에 은유적으로 녹아 있으며, 해산물을 담던 바래 소쿠리의 짜임은 가구의 디테일로 반영되었다.
외부 테라스에는 남해의 파식대를 모티브로 한 수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파도에 깎여 생긴 해안선의 형태는 낮게 흐르는 수면과 계단식 레벨, 그리고 조형화된 암석들로 형상화되었다. 이 암석들은 마치 남해 해안에 흩어진 작은 섬들을 떠올리게 하며, 수면 위에 반사된 윤슬은 실내 천장까지 번져 들어온다. 빛의 움직임은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며, 공간 전체에 바다의 시간을 조용히 퍼뜨린다.
옥상은 ‘따개비의 섬’이라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크기와 높낮이의 구조물들이 따개비 군락처럼 배치되었고, 조명이 아닌 햇살과 그림자만으로 공간이 채워진다. 옥상에서 바라보이는 남해 바다와 다도해의 섬들은 이 구조들과 시각적으로 겹쳐지며, 공간 자체가 주변 풍경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지형처럼 기능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표면적으로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남해라는 장소가 지닌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 손으로 쌓인 일상의 축적 같은 감각적 요소를 공간의 구조와 물성, 빛의 움직임으로 옮기고자 했다.
외부 테라스에는 남해의 파식대를 모티브로 한 수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파도에 깎여 생긴 해안선의 형태는 낮게 흐르는 수면과 계단식 레벨, 그리고 조형화된 암석들로 형상화되었다. 이 암석들은 마치 남해 해안에 흩어진 작은 섬들을 떠올리게 하며, 수면 위에 반사된 윤슬은 실내 천장까지 번져 들어온다. 빛의 움직임은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며, 공간 전체에 바다의 시간을 조용히 퍼뜨린다.
옥상은 ‘따개비의 섬’이라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크기와 높낮이의 구조물들이 따개비 군락처럼 배치되었고, 조명이 아닌 햇살과 그림자만으로 공간이 채워진다. 옥상에서 바라보이는 남해 바다와 다도해의 섬들은 이 구조들과 시각적으로 겹쳐지며, 공간 자체가 주변 풍경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지형처럼 기능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표면적으로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남해라는 장소가 지닌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 손으로 쌓인 일상의 축적 같은 감각적 요소를 공간의 구조와 물성, 빛의 움직임으로 옮기고자 했다.